부서간 자리 이동 예정.
1년도 되지 않았건만 어느 새 한번에 옮길 수 없을 만큼의 짐.
산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버릴 수도, 들고 갈 수도 없는 짐을 쌓아가는 것일 지도.
탐욕하고 갖고 모아두는 것보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어려운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고 있는 짐인 탓에?
짐.
짐스럽다.
봄이 왔는데, 짐이 무겁다.
보다
가벼워지도록 하자.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전자상거래와 마케팅, 디지털 컨텐츠, 앱스토어, 모바일 게임에 20년 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 전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삶에는 후회가 없게,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게. 세번째의 암과 싸우는 cancer survivor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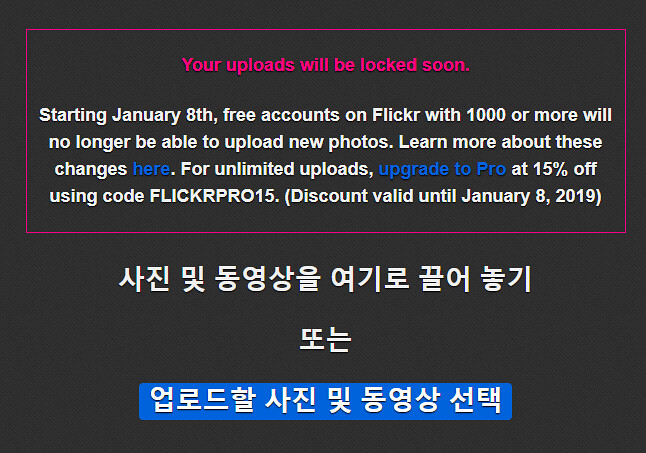
또! 진로상담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짐에 내 짐을 안겨드릴 뻔했군요.
어제 전교수님 만나 뵈었는데, 민호군은 출판사를 하루라도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하시던걸.
친한 선배가 [아무 것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읽고 느낀 바가 있었단다. 사물과 정념에 집착하는 현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나침판이라며 흥분하더군.
책을 읽고 잔뜩 고무된 선배는
옷과 신발, 책, CD, 각종 잡동사니들을(대부분 쓸만한)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덕분에 나도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었지.
나중에 선배집에 놀러갔더니 버리거나 나눠준 만큼의 새로운 물건들이 눈에 띄더라구.
"버리는 삶을 추구한다더니 뭘 사들인 거유?"
선배가 태평스럽게 대답하더만.
"채워야 또 비울 수 있지."
간만에,, 이리저리 떠나니다 들렀는데…알찬 이공간이.. 후후,, 잡념이나 끄적이고 카트라이더에 몸을 맞기는 제처지는 이제 마냥 형하구 멀어져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