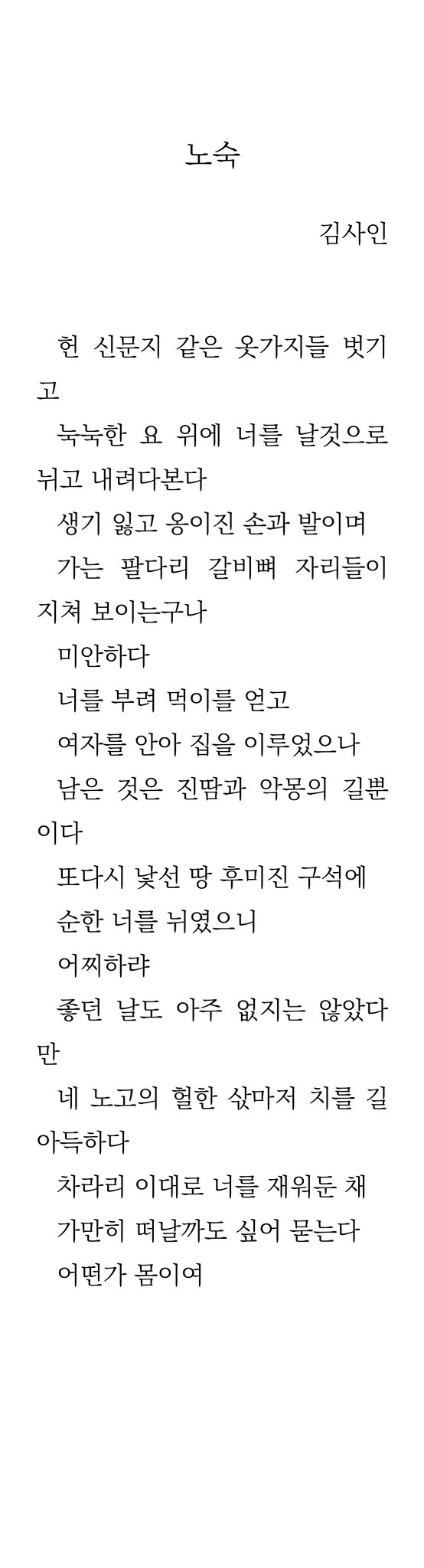시를 읽는 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아니 즐겁다기보다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좋은 시를 발견하고 마음에 드는 싯구를 찾아내는 순간만큼 뿌듯한 일은 흔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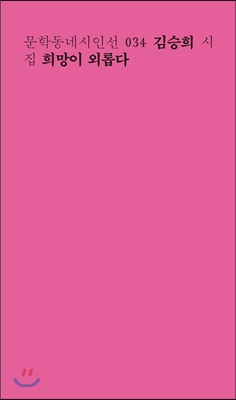
김승희 시인은 딱히 마음에 둔 시인은 아닌대, 제목이 눈에 띄어 담았습니다.
‘하물며’라는 말, ‘부디’라는 말, ‘아직’이라는 말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사구의 의미를 확장하고 새롭게 다듬은 시들이었습니다. 이미, 어쨌든, 비로소, 아랑곳없이, 저기요, 아~ 등등입니다.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말장난 같지만 ‘그래도’라는 부사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터에서 지는 싸움을 다 싸우고
자유인의 꿈
시선으로 포위된 땡볕, 장마당 한복판에
피 흘리는 심장을 내려놓았을 때
징 소리가 울리고
막이 내리고
그런 패배를 견뎌야 자유인이 되더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흘러가는 구름이나 흰 파도, 갈매기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런 인식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버티는 근력이 될텐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물며’라는 말
하물며가 없다
마음이 마음이 아닐 때 들려오는 말이여.
…
한 번 더 은은히 돌아보는 눈길 같은 말이여
하물며. 라고 나즈막하게 내뱉어 봅니다. 하물며 이렇게라도 살아있는데…
바람은 불며
‘부디’라는 말
부디라는 말을 남기고
꽃송이는 떨어지며
부디라는 말을 퍼뜨리고
논밭은 하늘을 보며
부디라는 말을 올리고
부디. 라고 되풀이하고, 마음 속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라고 시작하는 말은 처연하고 간절합니다.
언제 찬란했냐는 듯
‘아마’라는 말
겨울의 눈송이가 다 녹아 스며들었다는 말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라는 말을 사라지는 찬란함에 비유했는데, 이것도 그럴법 했습니다.
2부에는 ‘서울의 우울’ 연작이 실려있는데, 일찍이 장정일 시인이 묘사한 ‘가진 것이 없으면 외로운 도시, 서울’이라는 싯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장자연의 유서와 장자연을 위한 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장자연의 유서가 원수를 향한 단도라고 표현했지만 그 단도는 결국 원수의 심장에 닿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해쳤는 지 그렇게 자세히 밝혀줬는데도 이 사회는 이 법정은 이 권력은 아무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썩은 사과를 내버리지 않으면 사과 상자 안에 든 모든 사과가 같이 썩어버리는 데 말입니다.
서울의 우울 10
– 장자연의 꽃송이…
서울의 우울 10
유서를 쓰려거든 똑 이렇게 쓰렸다!
원수여, 내가 너를 단죄하러 가는 길.
…
어쨌든 서울이 소비한 여자
…
찢어진 옷고름
피 묻은 흰 치마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만 푸르르고
그러면 그럴수록 깨끗이 면도한
아침 서울의 면상
한강 속에 가라앉은 것들을 상상하는 서울의 우울 12도 괜찮았습니다. 낡은 신문지들, 호외들, 6.25 때 끊어진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들, 보따리들, 가난한 여자들, 삼류 인생들, 녹슨 밥숟가락들…
반면 3부의 시들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짜르트의 엉~덩이 연작은 시인의 마음이나 의도가 와 닿지 않아 공감할 수 없었고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주중에 다시 몇권의 시집을 골라봐야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전자상거래와 마케팅, 디지털 컨텐츠, 앱스토어, 모바일 게임에 20년 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 전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삶에는 후회가 없게,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게. 세번째의 암과 싸우는 cancer survivo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