ㅐ최근 몇 년은 책을 많이 읽지 못했고 특히 시집은 일년간 열권도 읽지 못했습니다. 지난 번 김승희의 시를 읽으면서 새로운 시인과 시구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다시 알게 됐습니다.
박형준과 이장욱이 엮은 시집 ‘걸었던 자리마다 별이 빛나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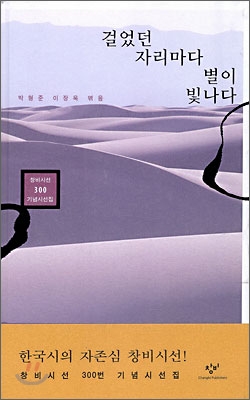
시 ‘가구의 힘’과 시집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련다’를 통해 박형준 시인은 제가 손에 꼽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박형준 시인의 시를 읽으면 스산한 겨울 공원 벤치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 그렁하죠.
어떤 시를 골랐을까 궁금해 하며 시집을 읽었습니다.
최영철 시인의 ‘성탄 전야’가 가장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말로 그려낸참혹한 일상이라니. 이렇게 차갑고 무섭게 표현할 수 있구나.
성탄 전야
최영철
맛난 것 먹고 빵빵해진 일가족 오색 풍선 따라
땡그랑 땡그랑 배고프다 노래하는 자선냄비 따라
행복 몇 스푼 눈발로 내리고 있었대요
더운 국물이나 마셔두려는 가난한 식탁에
저 멀리 하늘에서 뭉텅뭉텅 수제비 알로 오시다가
하얀 쌀 소록소록 눈발로 오시다가
그만 내려앉을 곳 잃고
성탄 폭죽 선물꾸러미 어깨 위로 내리고 있었대요
하얀 쌀 수제비 빈 장독에 닿기를 기다리다
네살 두살 아이 재워두고 엄마는 술집 나가고
아빠는 인형 뽑으러 가셨대요
인형 다 뽑으면 시름 다 가고 꿈 같은 새날 온다며
아이들 깰까봐 살금살금 문 잠그고 가셨대요
꿈결 아이들 구름 타고 다니며
하얀 쌀 수제비 받아 붕어빵 빚고 산새로 날리고
불살라 언 손발 쬐며 다 녹여버리고
엄마 아빠 오시면 야단맞을까봐
그 불길 따라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었대요
소방차 오고 아빠는 눈이 커다란
눈사람 인형 한아름 뽑아오셨대요
아이들 훨훨 날개를 단 줄 모르고
엄마는 실비주점 더러워진 접시를 닦으며
유행가 한자락 흥얼거리고 있었대요
성탄 전야 눈이 펑펑 내리는데 엄마는 돈 벌러 술집 주방에 나가 설겆이를 하고 아빠는 아이들 선물 주려고 인형을 뽑으러 갔습니다. 추위에 깬 아이들은 방안에서 성냥불로 불을 냈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 상상의 끝에서 그만큼 참혹한 현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나희덕 시인의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 간다’도 좋았습니다..
…
나희덕
조등 하나
꽃이 질 듯 꽃이 필 듯
흔들리고, 그 불빛 아래서
너무 늦게 놀러 온 이들끼리 술잔을 기울이겠지.
…
놀러 오라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너무 늦게 간 것이죠. 혹은 한번 더 보고 싶었는 데 그러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생각보다 아름다운 풍경이 떠 올랐습니다.
고형렬 시인의 ‘맹인 안내견과 함께’입니다.
…
고형렬
나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 맹인안내견으로 한 생 살다가
죽어서
그다음엔
다시 이 세상에 안 와졌으면
했다
…
다시는
이 세상이 미워서도 싫어서도 아닌데
돌아오고 싶지 않다
…
이시영 시인의 ‘최명희 씨를 생각함’은 두 노작가의 인연을 엿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혼불’의 최명희 맞습니다.
…도곡동 아파트가 가까워지자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울먹였다. “이형, 요즈음 내가 한달에 얼마로 사는 지 알아? 삼만원이야, 삼만원…… 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모두 거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어?” 고향친구랍시고 겨우 내 손을 잡고 통곡하는 그를 달래느라 나는 그날 치른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몽땅 잃어버렸다…
이시영
김태정 시인의 ‘낯선 동행’은 우리의 어떤 젊은 한 때를 보는 것 같아 회상에 잠겼습니다.
오년 뒤엔 뭐 하고 있을 거냐고 그가 물었다…그의 쓸쓸한 의도를 알라차려 문득 슬픈 나는 오년 뒤 서른다섯.
김태정
…
…그를 비껴간 대답이 어색하나마나 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을 뿐, 그때 나는 서투르고도 어수룩한 갓 서른이었으므로.
…
오년 뒤를 물어보던 그 폐허에서 그를 비껴간 대답처럼 그의 절망을 비껴간 나는 여전히 할 말이 없어 부끄럽고.
비 가는 소리에 잠 깼다
유안진
…
가는 소리 들리니 왔던 게 틀림없지
밤비뿐이랴
젊음도 사랑도 기회도
오는 줄은 몰랐다가 갈 때 겨우 알아차리는
…
왔던 것은 가고야 말지
사랑도 밤비도 사람도 … 죄다.
맹문재 시인의 ‘안부’에서는 누군가의 주름진 손과 말투가 생각났습니다.
시골에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맹문재
췌장암이 믿기지 않아
서울의 큰 병원에 확인검사를 받으려고 올라오신 큰 고모님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 문재가 사는데, 문재가 사는데…
…
나는 서울의 구석에 처박혀 있어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일까
…
내게 부담된다고 아무 연락도 안하고
하늘까지 그냥 가신 큰고모님
아귀다툼의 이 거리를 헤치고 출근하다가 문득
당신의 젖은 손 같은 안부를 듣는다.
시집의 제목이 맘에 듭니다. 당신도 나도 아닌, 우리가 걸었던 길이 사실은 늘 빛났다고 생각하는 시인(들)의 온기가 부럽습니다. 성탄전야에 하늘로 올라가버린 아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빛나야 하고 빛나는 삶을 위해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전하는 의지도 드러나고요.
내일 아침 병원 진료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텅 비운 속을 달래듯 마음을 위로해 봅니다. 사는게 싫지도 좋지도 않은데 저도 다시는 세상에 오고싶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전자상거래와 마케팅, 디지털 컨텐츠, 앱스토어, 모바일 게임에 20년 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 전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삶에는 후회가 없게,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게. 세번째의 암과 싸우는 cancer survivo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