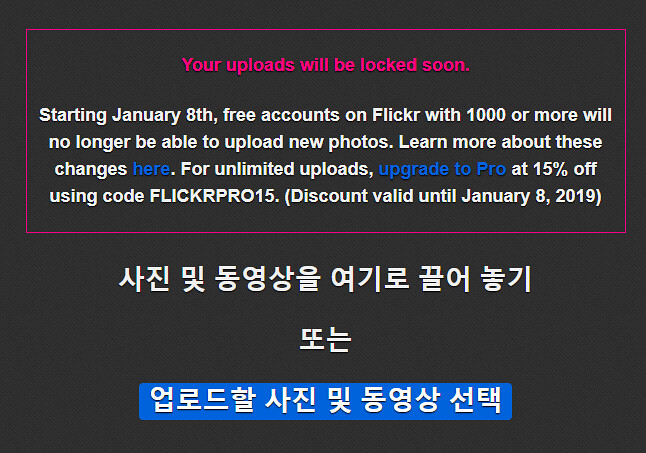오늘 (12시가 지났으므로 사실 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오늘이 바로 2004년의 마지막 휴일이라는 소리였다.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시간의 분할이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음을,
진작에 알아버린 이후로 살아가는 일은 힘겹다.
루카치가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해 놓아서 인용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저 쌀쌀한 바람이 몸을 움츠려 들게 만드는 겨울의 한 길목일 뿐인 것을, 사람들은 그것이 몹시 대단한 발견인 양 떠들고 다닌다.
그렇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가가 삶의 질을 점점 더 저하시키고 있다.
30분 단위의 일정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별을 바라보면서 내일이나 모레 또는 ‘조만간’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바람의 방향을 느껴 가야할 곳을 정하고 따라가는 시대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가 말인가.
까베르네 소비뇽이면 어떻고, 막소주면 어떤가.
이 추운 밤을 녹여줄 따뜻한 술 한 잔인 것을.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전자상거래와 마케팅, 디지털 컨텐츠, 앱스토어, 모바일 게임에 20년 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 전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삶에는 후회가 없게,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게. 세번째의 암과 싸우는 cancer survivo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