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아무래도 안 좋은가 봐.
꿈도 이상한 꿈만 계속 꾸고
어제는 생전 안 나타나던 길순이가
명림이랑 같이 집에 온 거야. 깜짝 놀라서
“길순아, 너 죽었잖아?!” 그랬다?
조직 검사 결과를 며칠 앞둔 언니가
겁먹은 목소리로 전화했다.
― 동네 의사가 괜찮을 거라 했다며?
마음 편히 가져.
너무 불안해하니까 당연히 그런 꿈을 꾸지.
그나저나 죽은 사람한테
“너 죽었잖아?”라니, 잔인하다.
― 놀라서 그랬지 뭐, 이상하잖아.
― 그러니까 길순 언니가 뭐래?
― 몰라, 그러고 나서 깼어.
매일 30분씩 훌라후프 돌리기
한 시간 조깅
30분 수영
저녁 6시 이후는 금식
이렇게 사는 언니는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라는 와중에
제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며 내 체중을 묻는다.
차마 바로 대지 못하고 좀 뺐는데도 언니가 기함을 한다.
― 미쳤다, 너! 그럼 너 허리선도 없겠네? 어떡하니!
이 인간 오래 살겠네.
― 그렇지, 뭐.
건강검진 받아라. 특히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한다. 군것질 끊어라. 6시 이후에는 먹지 마라. 운동해라. 많이 걸어라. 땅콩은 백해무익이니 먹지 마라. 아몬드랑 호두 챙겨 먹어라 등등.
뜨끔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
피가 되고 살은 안 될 말씀을 들려주시느라 언니는 생기발랄해지고
즐겁게 말을 늘이다가
이제 수화기 들고 있기 힘들다는 내 호소에 깔깔 웃으며
“그래, 오래 통화했네!”
끊기 힘들어서 받기 두려워라, 언니의 전화.
나는 진심
길순 언니 대답이 궁금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만나는 걸
꺼리지 않는다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죽는 게 그렇게나
무섭지 않을 텐데.
이 시는 (저처럼 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을 리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킥킥 거리며 다가서는 좋은 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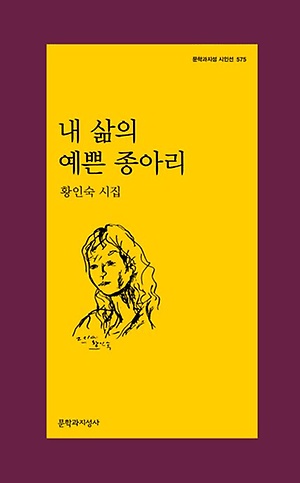
오래 전 죽은 누군가가 꿈에 등장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언니와 동생의 일상적인 통화를 엿듣고 있는 기분이죠. 땅콩을 먹지 말라거나 허리선이 없다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라거나 하는 대화의 끝에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한번쯤 이미 죽은 누군가를 떠올릴만한 시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그래서 시의 말미에 약간 맥이 빠졌습니다.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황인숙 시인은 아직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보지 못했구나 하는 추측도 했고요.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에 실감하는 때가 오면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겠네요.
진단 결과를 보고 수술을 기다리거나 혹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등의 힘든 시기에는 오래 전 돌아가신 아버지나 외할머니, D형 등이 그립기까지 했습니다.삶과 죽음은 (진부하지만) 하나의 동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답글 남기기